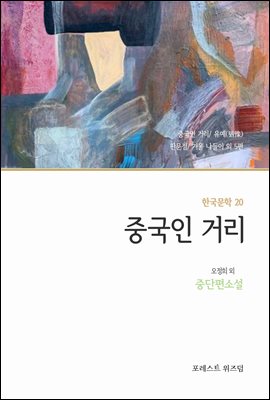
중국인 거리
- 저자
- 오정희 오상원 김동리 이호철 최인호 박경리 박완서 저
- 출판사
- 포레스트 위즈덤
- 출판일
- 2024-02-15
- 등록일
- 2024-12-12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8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여성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만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어 갈등하는 여성의 삶을 그린 소설!!
나는 잊혀진 꿈속을 걸어가듯 노란빛의 혼미 속에 점차 빠져들며 문득 성큼 다가드는 언덕 위의 이층집들과 굳게 닫힌 덧창 중의 하나가 열리고 젊은 남자의 창백한 얼굴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중국인들의 집이 늘어선 언덕 위의 어떤 집에서, 일인칭 서술자는 젊은 청년의 얼굴을 보게 된다. ‘나’가 같은 동네에 사는 매기 언니라는 한 양공주의 집에서 처음으로 어른들의 음료인 술을 마시던 순간, 그녀는 우연히 건너편의 그 청년과 또 눈이 마주치게 된다. 창문 사이로 아련하고 아름답게 나타나는 청년의 얼굴은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서술된다. 그때마다 소녀가 느끼게 되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슬픔은 우리도 한번쯤은 겪었을 감정의 성장통(成長痛)일 것이다. 같은 공간에 속한 타인들을 두려워하던 그녀가 타인에게 매혹되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지니는 야누스적인 특성을 온전히 드러낸다.
《역마(驛馬)》 역마살로 표상되는 동양적이며 한국적인 운명관을 형상화했다. 하룻저녁 놀다 간 남사당패에게서 옥화를 낳은 할머니, 떠돌이 중으로부터 성기를 낳게 된 옥화, 마침내 엿목판을 메고 유랑의 길에 오르는 성기 등 이들 가족은 인연의 묘리와 비극적인 운명의 사슬에 매여 있는 토착적 한국인의 의식세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김동리의 전통지향적인 의식을 나타낸 초기 대표작이다.
《타인의 방》 일상적인 삶의 감각이나 지각에서 인식하였던 사물의 익숙하고 순종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물건 자체의 독자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 그 스스로는 고독을 느끼고 거울 속에서 ‘늙수그레한 남자’ 인 자신을 타인으로 발견하기에 이른다. 사물의 인식을 통하여 일상적 삶의 인식과 사물 자체의 의미 사이의 격차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그’ 라는 주인공의 의식세계를 통하여 삶에 내재한 개인적 고독 내지는 단절된 현대적 삶의 의미를 보여주며 이를 하루 저녁의 생활을 통하여 적절히 서사화하였다. 작가는 이러한 작품을 통하여 비친숙성(非親熟性), 즉 낯선 의미를 발견하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의식추구의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을 이루어놓고 있다.
